[포토] 2025 리스타트 잡페어 26일 '성료'
2025-09-26

이제 ‘은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대세가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다. OECD 회원국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 하지만 노후의 일자리가 모두 만족할 만한 일자리는 아니다. 생활비로도 턱 없이 부족한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노구를 이끌고 다시 일터로 나오는 노년층이 상당하다.
20세기 중반만 해도 40년 정도를 일하고 은퇴하면 10년 정도 노후를 즐기다 세상을 떠났지만, 요즘은 평균수명이 최소 10년 정도는 더 늘었기에 40년을 일하고 퇴직해도 추가로 20년을 더 버텨내야 한다. 연금이 있다지만 생활비를 다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는 결국 노후의 ‘세컨드 잡(Second Job)’을 갖는 것 외에 딱히 대안이 없다.
<숫자 한국>의 저자인 박한슬 약사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기고한 글에서, 택시기사 된 전직 고위공무원의 사례를 들어 ‘평생현역’의 비결을 소개해 주목을 끈다.
박 약사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평균 희망 은퇴 연령이 73세에 이르지만, 그 목적이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이 월 207만 원인 반면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월 연금액은 8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노동’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약사는 한국 노년의 ‘일하는 현실’은,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저임금과 저숙련,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재취업 이후의 직종을 봐도, 주로 남성 노인들이 종사하는 아파트 경비·청소·주차 관리 같은 단순 노무직이나 주로 여성 노인들이 종사하는 돌봄·간병 보조가 대부분이다.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영세 자영업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퇴직금을 종잣돈으로 해 치킨 집이나 작은 식당을 여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요식업의 5년 생존률이 2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부의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이 일부 도움을 주지만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 제공된 약 107만 개의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공원 청소나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같은 단시간 사회공헌형 일자리였다. 수당이 월 생활비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월 10만~30만 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10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릴 만큼, 노후 일자리 환경은 열악하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까지 겹쳐 일자리 찾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단기 노동 중 청소나 배달, 돌봄 노동 등은 그나마 일부 가능하지만, 상당수 노년층은 디지털 문해력이 낮아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니어 디지털 교육 확대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 인력들은 오프라인 인력사무소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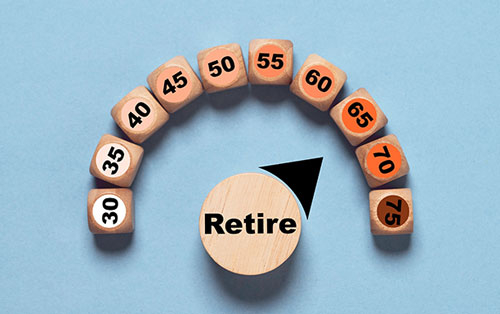
박 약사는 “‘평생 현역’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생계형·저임금·저숙련 분야에 묶여 있어 일자리의 질이 좋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결국 노년을 대비해 ‘좋은 세컨드잡’을 미리 준비하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약사는 일본의 정년 연장 정책을 먼저 언급했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정년을 65세로 직접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거나, 정년은 유지하되 희망자가 있으면 재 고용토록 유도했다. 최소한 계약직 형태로 노인들을 재 고용하게 만들어 노동인구 감소에도 대응한다는 취지다. 참고로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폐지된 상태다.
박 약사는 노인 개개인의 전문성을 더 살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시니어 전문가 서비스(SES)’를 통해 은퇴 기술자·경영자가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단기 프로젝트를 돕도록 하는 윈윈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는 “우리 역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은퇴 전문가의 경험을 연결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도 전문성 있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런 ‘좋은 노년 일자리’로의 전환을 꾀하려면 제도적 변화 외에 개인 차원에서도 준비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인맥과 업무 경험이 발휘되지 못할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역량과 직무 수준에서 시장 수요에 맞게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바뀐 역할을 이해해야 ‘평생 현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약사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고위공무원으로 은퇴한 운전기사가 모는 택시를 탔던 경험을 전했다. 험한 손님들을 만나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밤에 취객을 태우면 내 처지가 바뀌었단 것을 실감한다”면서 “처음에는 속이 상했지만 바뀐 역할을 받아들인 후엔 되레 마음이 편해졌다”고 답했다고 한다. 손주들 용돈 주고,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게 해주는 택시 일이 감사하다는 것이었다.
박 약사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은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됐다”면서 “별다른 대비가 없던 사람들은 저숙련 저임금 단기 노동으로 빠지게 되지만, 그간 삶의 경험을 잘만 정리한다면 질 좋은 노년 세컨드 잡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마음가짐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뀐 역할을 이해하고 납득하지 않는다면, 그마저 얻은 괜찮은 일자리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평생 현역’이란 말은 기술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따라 ‘평생 바뀌는 일’을 맡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력과 마음 정리를 은퇴 전에 미리 마쳐두는 준비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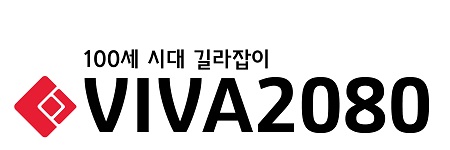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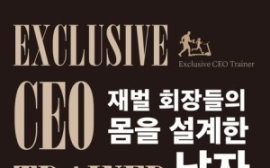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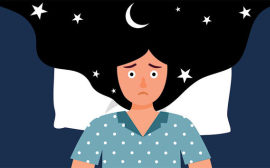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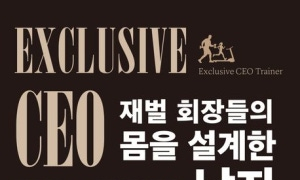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