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 대출 규제 강화에 전세금 반환 소송 증가... 계약 만료 2개월 전 내용증명 준비
2025-09-30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명도소송이 가능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이 충돌하는 탓에 현장 혼란도 적지 않다고 한다.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계약이 종료되었다. 명도소송이 왜 불가능한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긴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갱신요구권에 따른 계약 종료만으로 곧바로 명도소송을 할 수는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경신요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나.
“그렇다. 법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다.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이 문제다.”
-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충돌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민간임대주택법 상으로는 단기 임대주택은 4년, 장기 임대주택은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즉,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 끝나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다면 명도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때문에 분쟁이 잦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이라면 계약 종료를 이유로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차임 2기 이상 연체, 불법 사용, 무단 전대, 주택 멸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임대인의 지위가 단순한 집주인과 달리 등록사업자로서 공적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갱신요구권 뿐만아니라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역시 계약종료만을 이유로 무리하게 명도소송을 추진하기 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응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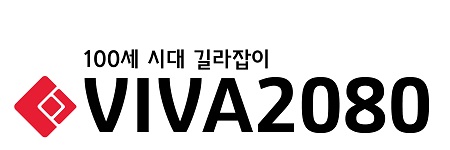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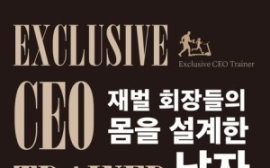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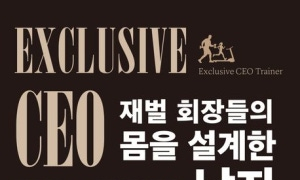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